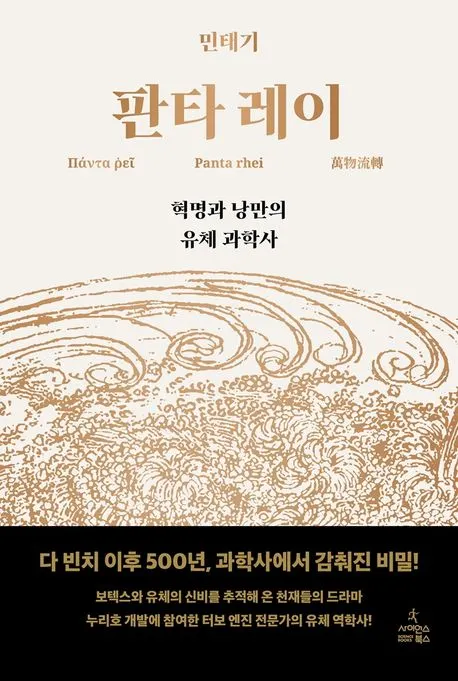유체 역학과 관련한 과학사를 다룬 책. 유튜브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다룬 컨텐츠를 보면서 저자의 박학다식에 감탄했었는데, 그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단순히 유체역학 자체만 다룬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이어져오면서 당대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 그간 역사를 수직적으로만 배웠다면, 이 책은 당대의 과학, 사회에 걸친 다양한 수평적 이야기가 함께 다뤄져서 실제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revolution이 어떻게 혁명을 의미하게 되었느냐인데, 원래 천구의 회전을 의미하던 revolution이 권력의 회전으로 이어져 revolution이 혁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책의 말미에 저자가 이야기 했듯이 실제 과학사에서 한 분야만 판 과학자는 드물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했고, 그것이 진정 과학의 모습이라는 말도 인상적.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다빈치만 알려져서 그렇지 한 분야만 파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고 그것이 혁신을 일으키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 함. 책 자체가 무척 재미있고, 다양하게 연결된 과학사를 다루는 책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읽어볼 만한 책.
이처럼 수백 년에 걸친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단 한 번도 과학 기술은 순수한 과학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다른 영역과 섞이며 스스로를 재창조하거나 소멸시켰다. 역대의 그 어떠한 대학자도, 노벨상을 받은 이 시대의 석학들도 결코 한 우물을 판 적이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경주마와 같은 눈가리개를 씌우고 특정 분야 속에만 가두려 하고 있다. 이런 반쪽 시각 때문인지 이를 틈타 일부 과학 평론가들은 현대의 과학적 성과들을 전혀 상관없는 내용과 연결시켜 과학을 신비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된 소위 대중 교양 과학은 과학을 데카르트 이전의 일원론의 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과학이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했다. 과학은 고립된 개별 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탄생시킨 우리 사회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민태기, <판타 레이>